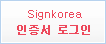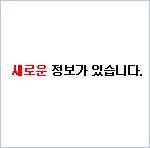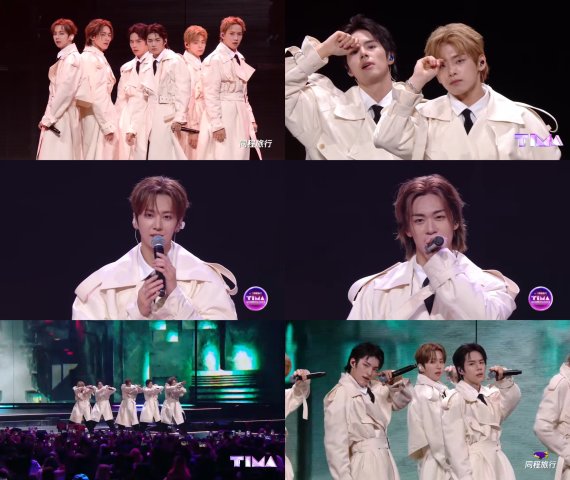[기자수첩] K뷰티에 드리운 '관세 그림자'
파이낸셜뉴스 | 2025-08-07 20:41:03
파이낸셜뉴스 | 2025-08-07 20:41:03
 |
| 이정화 생활경제부 |
K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K뷰티는 전 세계 소비자에게 익숙한 이름이 됐다. 특히 미국은 중국을 제치고 K뷰티 최대 수출국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K뷰티에도 통상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왔다. 당초 예고된 25% 상호관세는 피했지만 그간 면제됐던 품목에 15% 관세가 새로 적용되면서 업계에는 적잖은 긴장감이 돌고 있다.
미국이 한국산 화장품에 15% 관세를 부과한 것은 K뷰티에 분명한 부담이다. 특히 중저가 브랜드가 많은 K뷰티 특성상 가격 인상이 쉽지 않아 인디 브랜드일수록 수익성 방어가 어렵다. 아마존 FBA(Fulfillment by Amazon) 등으로 직접 미국에 제품을 판매해온 소규모 브랜드들은 관세 전액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반면 중견 브랜드 이상의 업체들은 수출원가 수준의 관세를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15% 상호관세는 소비자 판매가가 아닌 수출원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국내 주요 브랜드들은 현지법인을 통해 소매가의 30%가량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미국 유통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관세 인상분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초제품군처럼 대체재가 마땅치 않은 카테고리에서는 가격이 다소 인상되더라도 소비자가 이탈할 가능성이 낮다.
미국 내 초저가 화장품 시장을 주도하던 중국 브랜드들에 부과된 상호관세율은 30%로 한국보다 두 배 높다. 이 점은 K뷰티에 분명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관세 부담으로 중국 초저가 브랜드가 밀려난 자리에 K뷰티가 파고들 수 있다. 결국 관세는 K뷰티의 수익성을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시장 재편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제 K뷰티는 제품력과 트렌드만으로는 부족하다. 글로벌 통상환경까지 고려한 수출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순한 관세 대응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통상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관세 #K뷰티
이시각 주요뉴스
이시각 포토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