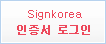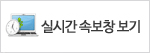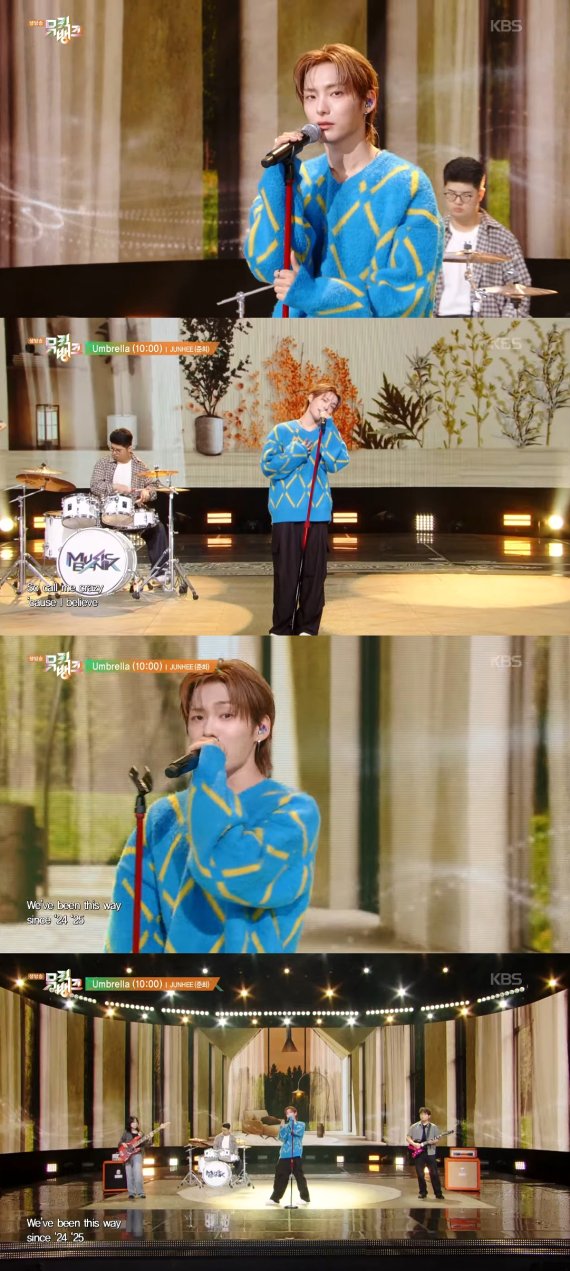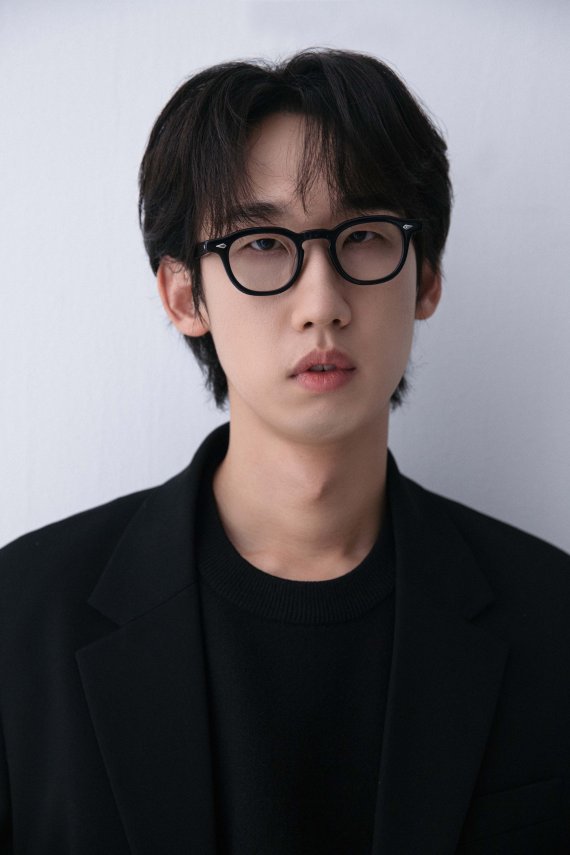[기자수첩] 실수요자 옥죄는 "집값 안정"의 역설
프라임경제 | 2025-09-05 15:50:33
프라임경제 | 2025-09-05 15:50:33
[프라임경제]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시행한 지 두 달이 지났다. 투기 수요 억제와 집값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장의 체감은 엇갈린다. 다주택자의 투자 열기는 꺾였으나, 청년과 신혼부부는 대출 한도 축소로 주거 선택지가 크게 좁아졌다. 정책은 과연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까.
이번 대출 규제는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과거 경험에서도 확인되듯, 과도한 대출은 투기적 수요를 키워 가격을 끌어올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973건으로, 6월(1만1933건) 대비 75% 급감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7.8%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연립·다세대 매매도 3831건에서 1914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단기 과열세를 진정시키는 효과만 놓고 보면, 정부의 규제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대형 아파트일수록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전용 102㎡ 초과 135㎡ 이하의 거래량은 1358건에서 277건으로 줄어들며 80% 급감했다. 60㎡ 초과 85㎡ 이하도 77% 감소했다.
이처럼 전 면적대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시장은 얼어붙었다. 다주택자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실수요자의 발길마저 막힌 점은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불편을 주더라도, 집값 안정이 장기적으로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한다. 집을 재테크 수단이 아닌 생활 터전으로 되돌려놓는 과정에서 일정한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집값 안정 없이는 주거 불안 해소도 없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청년과 신혼부부의 현실은 다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 이후 수도권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의 약 27.3%가 기존 조건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해졌다. 서울은 21%, 경기는 36.8%, 인천은 45.9%로 나타나 청년·신혼부부의 계약 성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 창구에서는 "어제와 오늘이 왜 다르냐"는 항의가 이어지고, 이미 계약금을 낸 이들은 갑작스러운 차액 발생에 발을 동동 구른다.
주거비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선을 넘어섰다. OECD에 따르면 가구 소득의 30% 이상이 주거비로 지출 시 '위험 수준'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4년 기준)에 의하면 수도권 청년 가구 주거비 부담률은 이미 35~50%에 달한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경우 매달 고정 지출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 이는 곧 결혼과 출산 계획을 미루게 만드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년들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것"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세대 간 자산 격차도 뚜렷하다. 39세 이하 가구주의 순자산 평균은 약 2억2158만원으로 지난 7년간 1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은 42.2% 늘어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이는 집을 통한 자산 증식 기회가 청년 세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정책의 한계는 획일성에서도 드러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기존 전세보증금의 90%에서 80%로 일괄 하향됐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 역시 평균 5000만~1억원 줄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서울과 지방, 고가와 중저가 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에 대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지방 청년들까지 똑같은 축소 폭을 감내해야 하면서 불필요한 박탈감이 확산됐다. 무엇보다 "왜 지금, 이 수준으로 줄였는지"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은 정책 신뢰를 흔들고 있다.
물론 대출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다. 부동산 시장은 한 번 과열되면 사회 전체로 부담이 전이되고, 투기 수요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면 실수요자의 피해가 붉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전면적인 규제만으로는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현실적으로는 이미 계약 단계에 있는 세입자에 대해선 예외 규정을 두고,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 계층에는 차등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이는 규제 효과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다.
대출 규제는 분명 필요한 약일 수 있다. 하지만 약은 용량과 복용법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그 약이 누구를 위해 쓰이고 있느냐다. 집값 그래프만 안정시킨 채 청년의 삶을 흔드는 정책이라면, 그것은 치료가 아니라 또 다른 병일지 모른다. '집값 안정'이라는 처방전이 과연 우리 사회에 맞는 해법일까.
이시각 주요뉴스
이시각 포토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