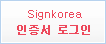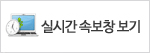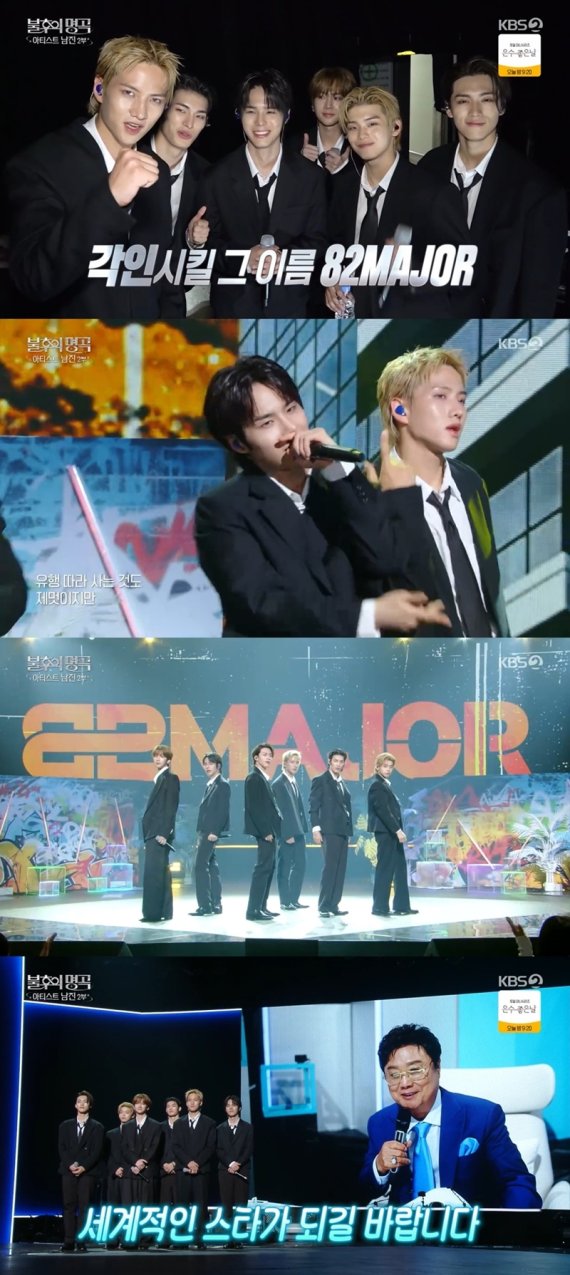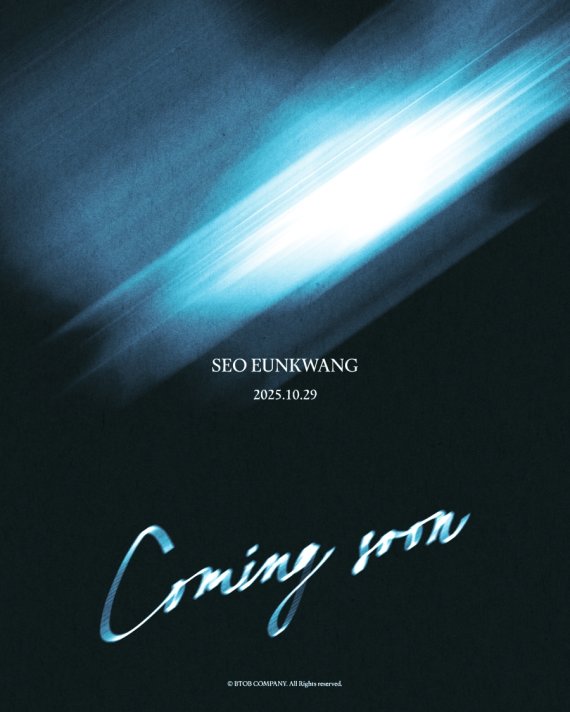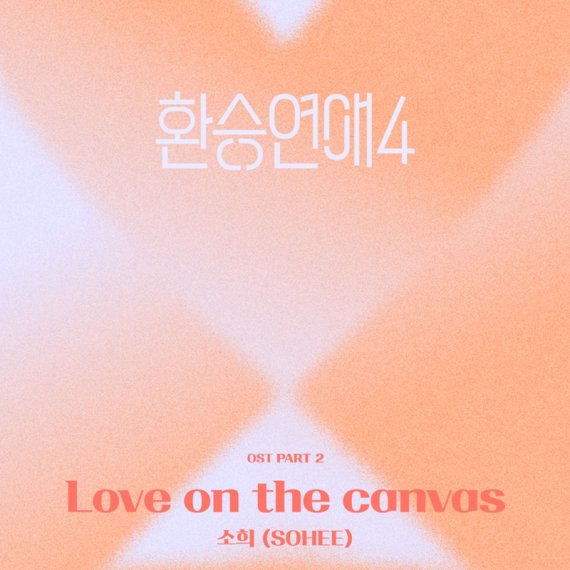[기자수첩] "합리적 소비" 착각 속 무너지는 K-브랜드 생태계
프라임경제 | 2025-10-27 14:22:45
프라임경제 | 2025-10-27 14:22:45
[프라임경제] K-브랜드 생태계가 '짝퉁 홍수'에 잠식되고 있다. 문제는 더 이상 일부 업계의 민원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 중소 제조기업 10곳 중 8곳이 대응을 포기했다는 조사 결과는, 이미 '경쟁 붕괴' 단계로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소매단위 민생 이슈'로만 다루며 소액면세 논란을 두고 여론 눈치만 보고 있다. 산업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본질적 과제 앞에서 정책은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중국산 위조상품으로 인한 한국 화장품 업계 피해액은 연간 2936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신고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고 본다.
최근 국정감사장에서는 부착형 배지부터 차량용 거치대까지 실물 비교 사례가 공개됐고, 정부는 "외형상 판별이 어렵다"는 답을 내놓았다. 현행 제도로는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지난해 소액면세 개편 시도는 사흘 만에 철회됐다. 주무부처는 여론 부담을 이유로 물러섰고, 다른 부처는 '소관이 아니다'라며 거리를 뒀다. 논의는 단순 관세 문제로 축소됐고, 품질·안전·지적재산권(IP) 침해라는 핵심 쟁점은 테이블 밖으로 밀려났다.
반면 중국은 2016년 이미 한국산 직구 소액면세를 폐지했다. 중국에 이어 해외 주요국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8월 800달러 이하 소액면세의 전면 폐지를 목표로 단계적 개편에 착수했고, 일부 저가품군에는 실질 관세 부과 범위를 이미 확대했다. EU도 2028년부터 150유로 이하 직구품까지 과세하기로 확정했다. 호주는 1000호주달러 이하 제품에도 10% 부가세를 부과한다. 한국만 사실상 '현상 유지'다.
정책이 서지 못하는 동안 시장 인식도 뒤집혔다. 이제 소비자는 '저가 직구=합리적 선택'이라고 받아들이고, 이 과정에서 K-브랜드 평균 품질력까지 함께 추락하고 있다. 중국 플랫폼이 잠식한 것은 단기 매출이 아니라 미래 수요다.
여기에 국내 가격 저항까지 겹친다. 소액면세 논의만 언급돼도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는 반발이 순식간에 확산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검증되지 않은 저품질 제품에 노출될 자유'까지 포함된 왜곡된 선택권이 존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강화라는 일차원적인 접근이 아니다. 해외직구의 편의는 유지하되 최소한의 품질 검증·표시·위조 판별 기준을 제도화해 '경쟁의 룰'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는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유지 비용이자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눈치 행정이 계속된다면 한국 소비자는 머지않아 K-브랜드가 아니라 'K-짝퉁'이 범람하는 시장 속에서 선택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시각 주요뉴스
이시각 포토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