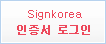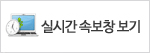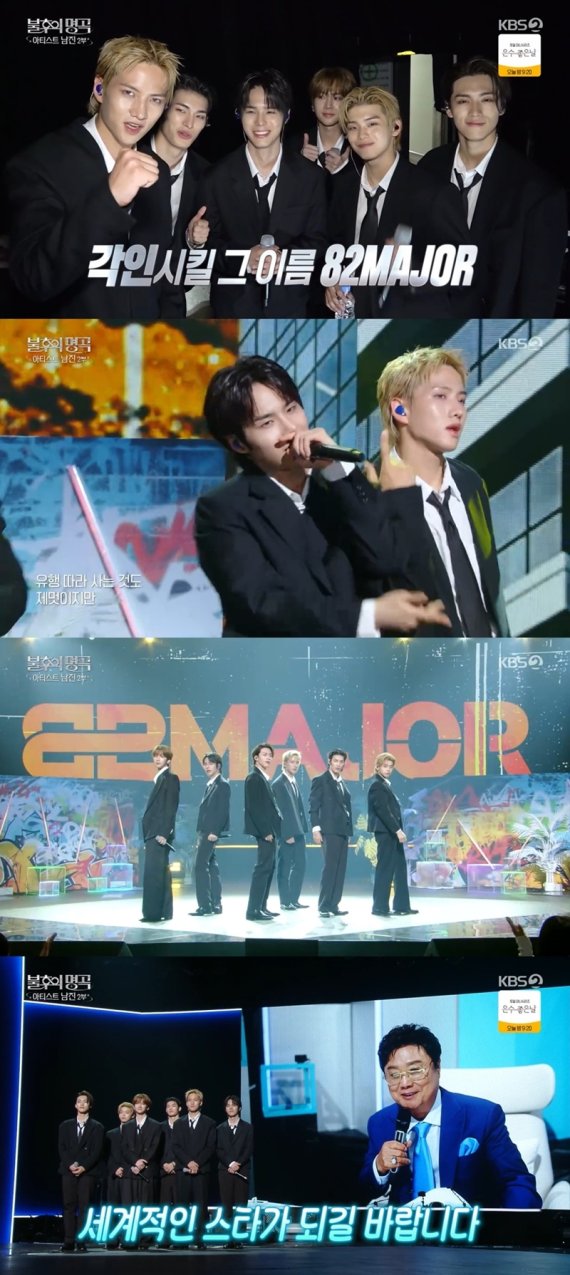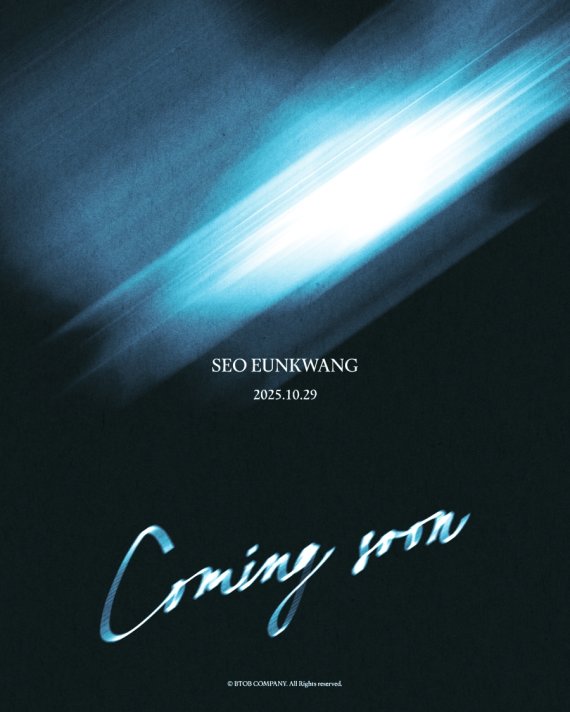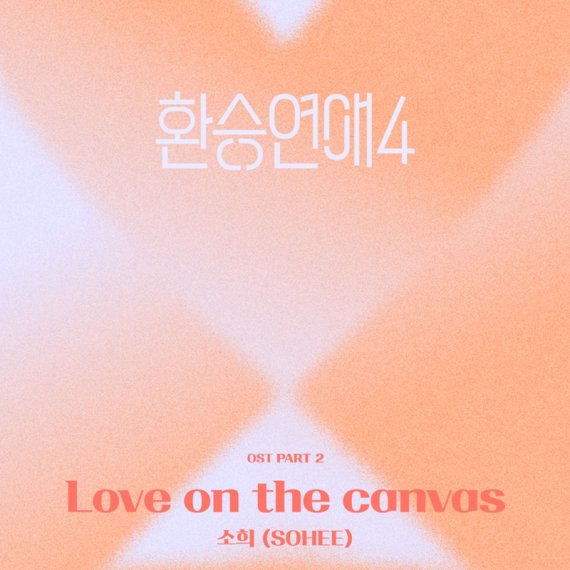[기고] 위암, 이젠 직업병이다
프라임경제 | 2025-10-30 09:55:11
프라임경제 | 2025-10-30 09:55:11
[프라임경제] 위암은 오랫동안 개인의 식습관이나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들 사이에서 위암이 반복적으로 발병됐다. 이런 사례들이 산재로 인정되면서 이제는 '직업병 위암'이라는 개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용접 △제련 △도금 △금속가공 등 금속을 다루는 업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접흄(fume)'에는 니켈, 크롬, 카드뮴, 망간, 납 등 다양한 금속성 분진이 포함됐다. 일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지정한 물질들이다. 이러한 물질이 장기간 체내에 흡입되면 위 점막에 만성적인 손상을 일으켜 결국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년 경력의 조선소 용접공 근로자 A씨는 위암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장기간 용접흄·금속 가루에 노출된 사실을 인정해 산업재해로 승인했다. A씨는 밀폐된 선체 내부에서 스테인리스강을 주로 용접했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6가크롬과 니켈이 발생했다.
의학 전문가들은 "이들 물질이 위 점막의 염증을 유발하고 발암물질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결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또 다른 사례는 25년 제련소에서 근무한 B씨다. 위암으로 사망한 B씨는 아연 제련 공정에서 △황산 △납 △카드뮴 △비소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됐다. 작업장은 환기시설이 미비해 장시간 유해가스를 흡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비소 및 카드퓸은 위암을 포함한 각종 소화기계 암의 위험을 높이는 인체 발암물질"이라며 산재를 인정했다.
이처럼 위암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관리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질병이다. 문제는 이런 사례들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도 자신의 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위암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의 근무경력, 실제 작업내용, 유해물질 노출 여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한다. 반면 근로자 스스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사업장에서 작업환경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자료가 오래돼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무사는 근로자의 진술과 산업안전보건자료, 기존 판례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구성하고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대리한다. 또한 심사나 재심사 단계에서 공단이 요구하는 근거를 법률적으로 해석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입증 전략을 세운다.
위암은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젊은 시절의 노출이 중년 이후의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미 오래된 일이라 산재가 어렵다"는 생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근무환경이 명백히 유해했고,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확인된다면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 물질은 시간이 지나도 몸속에 흔적을 남긴다. 위암은 그 흔적 중 하나다.
근로자의 질병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일터에서 비롯된 결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자, 산재보상제도의 존재 이유일 것이다.
이민희 노무법인 산재 노무사
이시각 주요뉴스
이시각 포토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